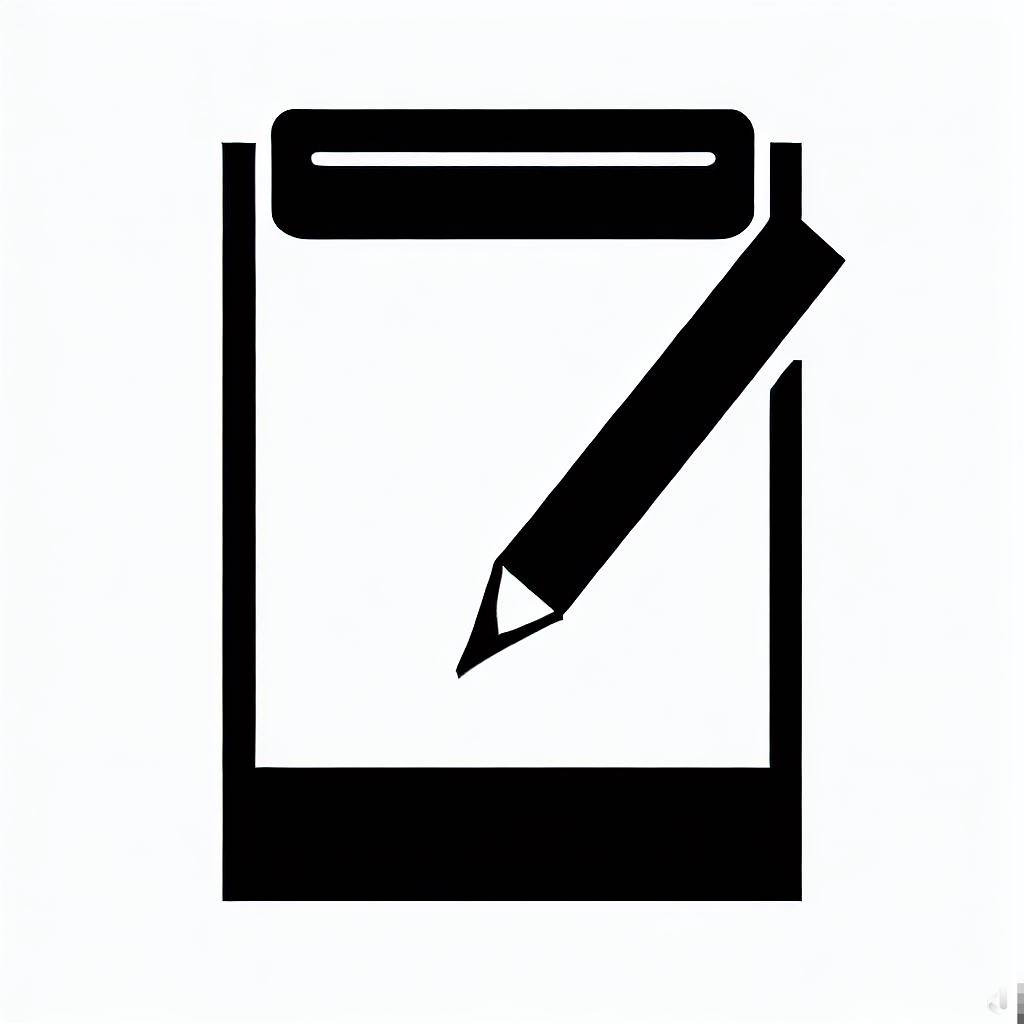작년 여름에 불교에 대한 단편적 지식으로 이상한 글을 몇 개 남겼었다. 그중에서 압권은 멸성제 = 삼법인이라는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논지를 펼쳤던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일체개고에 대해 "그건 고성제니까 주소를 잘못 찾은 것 같다.", "그건 굳이 부처님이 진리라고 따로 선언 안 해도 누구나 이미 명백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는 식으로 삼법인에서 내쳐버리는 무지를 보이기까지 했다. 삼법인은 멸성제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사성제와 불교 전반을 떠받느는 중추적인 기둥임을 몰라서 벌어졌던 오해였다. 그러다 보니 일체개고를 지워버리고 그 자리를 열반적정으로 대체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비록 그때 틀리긴 했지만 그래도 열반적정을 뺀 삼법인은 상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삼법인에서 사법인으로 확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면 불교의 진리를 단지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내가 생각해 본 사법인의 스토리텔링을 챗지피티가 더 보기 좋게 정리해 줬다.
불교의 사법인(四法印): 고통을 넘어선 평온으로 가는 길
1. 제행무상(諸行無常)
"모든 것은 변한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오늘의 기쁨은 내일의 슬픔이 되고,
지금의 만남은 언젠가 이별이 된다.
영원한 것은 없고, 고정된 실체도 없다.
이 진실을 직시할 때,
우리는 처음으로 지혜의 문턱에 선다.
2. 일체개고(一切皆苦)
"변화에 집착하기에 고통이 생긴다."
변화하는 세상을 고정시키려는 마음,
그것이 고통의 씨앗이다.
사라질 것을 붙잡으려 하고,
떠날 것을 머물게 하려 하니,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린다.
이 세상은 고통스럽다기보다,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
3. 제법무아(諸法無我)
"‘나’ 또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몸도, 생각도, 감정도 모두 변화한다.
그렇다면, ‘나’란 무엇인가?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수많은 조건이 모여 잠시 만들어 낸 그림자일 뿐.
‘나’에 대한 집착을 놓는 순간,
고통의 실체도 함께 사라진다.
4. 열반적정(涅槃寂靜)
"고요하고 평온한 자유의 경지."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집착이 고통이며,
고정된 나도 없다는 것을 깊이 통찰할 때,
고통은 더 이상 나를 잡아두지 못한다.
그 자리에 찾아오는 깊은 고요,
흔들림 없는 평온, 그것이 바로 **열반(涅槃)**이다.
이곳에는 더 이상 두려움도, 욕망도 없다.
진정한 자유와 해탈이 이 자리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