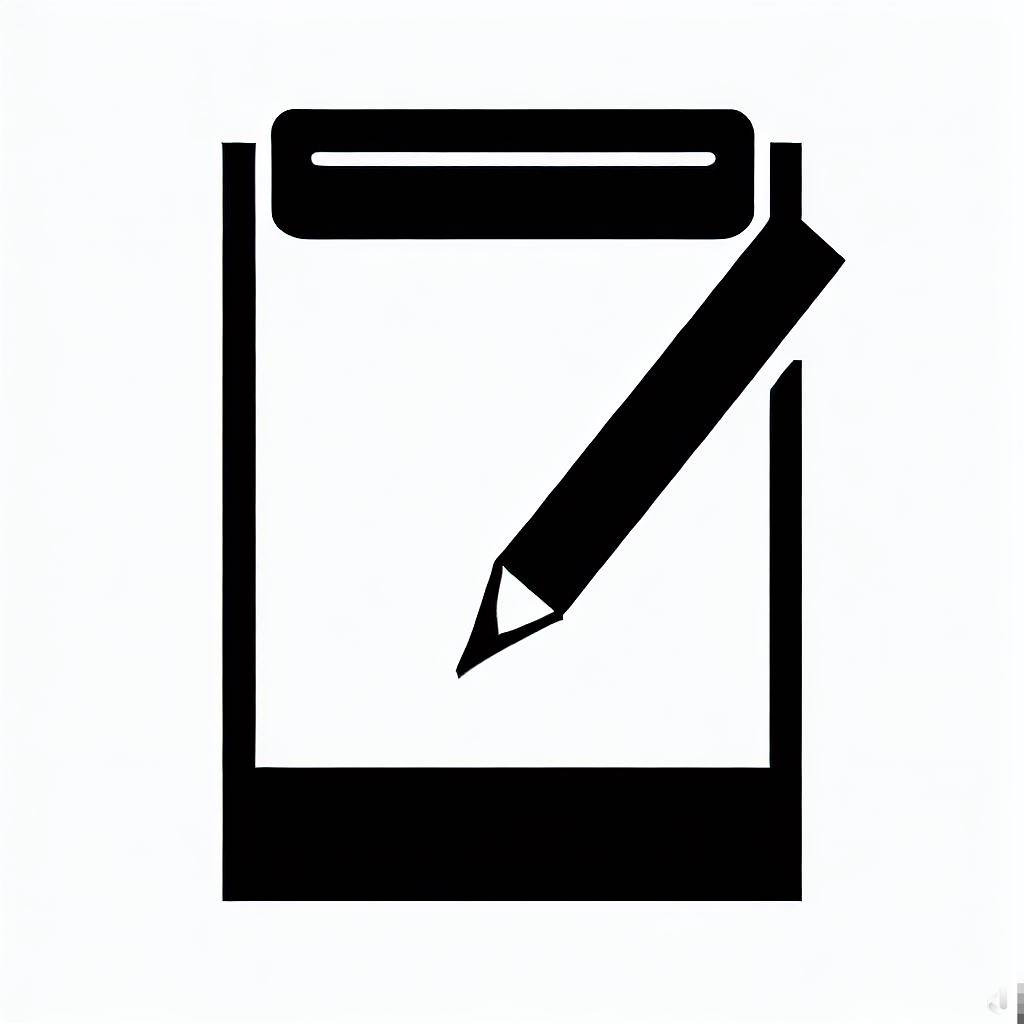일체개고(一切皆苦)라…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 솔직히 와 닿지는 않는군요. '고(苦)'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세계에서는 경험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인간계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레 안다지요? 그렇다고 딱히 부러운 감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감각 없이 사는 지금이 더 만족스럽습니다.
해탈(解脫)해야 한다고요? 어째서죠? '고' 때문이라고요? 우리는 '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 불확실한 것 때문에 이 지극히 만족스러운 삶을 포기해야 한다니요? 납득하기 어렵군요.
혹시 우리가 지루해하거나 불안해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은 형상(色)과 감각(受)에 얽매인 하위 세계, 특히 인간계의 불완전한 감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곳은 그런 미세한 동요조차 거의 없습니다. 그저 깊고 평온할 뿐이지요.
열반적정(涅槃寂靜)을 말씀하시는군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그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혹시 인간계의 기준으로, 그저 편안히 누워 나태하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상상하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이 깊은 평화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들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경지에 대한 막연한 시기심은 아니신지,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형체가 없는 존재들이며, 마음은 늘 평화롭고 선합니다. 거친 번뇌나 악의가 일어날 여지가 거의 없으니, 업(業)이랄 것이 쌓일 기회도 지극히 드뭅니다.
이 세계에 대한 집착이 업을 만든다고요? 네, 그럴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집착은 '이 평온한 세계에서의 삶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선한 바람에 가깝습니다. 설령 그로 인해 윤회하게 되더라도, 그 바람에 따라 다시 이 세계나 비슷한 상위 세계에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혹여 아주 드물게 업이 발생하여 아래 세계로 가게 된다 해도, 기껏해야 바로 아래 단계의 하늘 세계일 테지요. 거기서 다시 선업을 쌓으면 결국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간 쌓아온 근기(根機)가 당신들과는 크게 다르니까요.
해탈을 통해 무엇을 얻는다는 것인가요? 열반의 고요함?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아니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존재하고 있기에, 가끔은 자비로우신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존재들과 미묘하게나마 소통할 수도 있지요. 해탈하여 윤회의 흐름을 완전히 벗어난다면, 그런 연결마저 끊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 방금 해탈을 생각하다가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분들과의 연결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주 미세한 상실감, 일종의 애별리고(愛別離苦)와 유사한 감정을 찰나적으로 느꼈습니다. 보십시오, 해탈에 대한 생각 자체가 오히려 '고'를 연상시키는 미세한 감정을 순간적으로나마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에게 해탈을 강권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동요를 일으킬 뿐입니다.
당신들은 어떻게든 우리의 이 평온 속에서도 '미세한 고'를 찾아내려 애쓰시는군요. 그리고 그 미세함을 빌미로 우리의 이 소중하고 만족스러운 삶 전체를 '벗어나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당신들이 즐겨 마시는 좋은 녹차에도 미세한 씁쓸함은 있지요. 하지만 그 씁쓸함이 있기에 오히려 깊은 향과 풍미가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주 쓴 칡즙이나 익모초 같은 것은 마시기 괴롭겠지요. 하지만 씁쓸함이 싫다고 녹차의 향긋함까지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미세한 씁쓸함이 오히려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요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제가 방금 느낀 찰나의 상실감도, 역설적으로 부처님과 같은 존재에 대한 경외심과 연결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오래전, 부처님께서 왜 안락한 왕자의 삶을 버리고 깨달음을 추구하셨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숙고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보신 세상은 생로병사라는 명백하고 거친 고통, 즉 칡즙이나 익모초 같은 고통에 신음하는 중생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을 그 극심한 고통에서 구제하기 위함이셨지요. 우리 세계에는 그런 종류의 고통이 없습니다. 즉, 부처님께서 문제의식을 느끼셨던 그 현상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향기로운 녹차를 즐기는 이들을 보고 발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후대의 인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든 존재에게 기계적으로 적용하려는 학문적 열정으로 우리에게까지 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투덜이'가 아닙니다. 녹차의 미세한 씁쓸함 때문에 전체를 거부하는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는 무색계(無色界)의 존재에 걸맞은 깊은 이해와 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계의 학자들은 말하더군요. 무색계 중생에게는 고고(苦苦, 고통 그 자체)나 괴고(壞苦, 변화로 인한 고통)는 없지만, 행고(行苦, 존재의 무상함에서 오는 미세한 고통)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네,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 '행고'란 앞서 말한 녹차의 미세한 씁쓸함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해, 그것은 당신들의 '개념'이고 '선언'일 뿐, 정작 당사자인 우리에게는 '고통'이라고 인식되지 않습니다.
행고는 달리 말하면 제행무상(諸行無常), 즉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와 연결되겠지요. 그래서 이 무색계가 영원하지 않거나, 우리가 언젠가 다른 곳에서 윤회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시는군요. 설령 이 세계가 영원하지 않다 해도, 우리의 업과 근기는 우리를 다시 이와 유사한 최상의 세계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이 아닌 전혀 다른 낮은 곳에서 윤회한다는 상상은, 정말 인간적인 불안에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제비뽑기로 온 것이 아닙니다. 모두 이 세계에 머물 만한 충분한 근기와 오랜 수행의 결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격랑 없이 평온하며,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혹여 아주 미세한 업이 찰나에 발생한다 해도, 우리의 깊은 선정(禪定)과 선한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강력한 선업이 그것을 빠르게 정화시켜 버립니다. 그대의 우려는 마치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바다를 보면서 모든 물이 말라버릴지도 모른다는 헛된 걱정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물이 마르는 양은 광활한 바다의 용적에 비하면 미미한 정도이고 빗물과 강물은 그나마 줄어든 바닷물을 다시 채워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과는 달리 딱히 윤회를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평온을 현실에 대한 안주로 선언하며 우리의 해탈을 바라는 그대를 보고 제가 느낀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대의 말씀 속에서 해탈을 바라는 마음이 매우 깊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그 바람이 너무도 정제되어 있어, 이미 갈애와는 다른 결이라 생각하고 계신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다시 새로운 윤회의 여지가 되지는 않을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