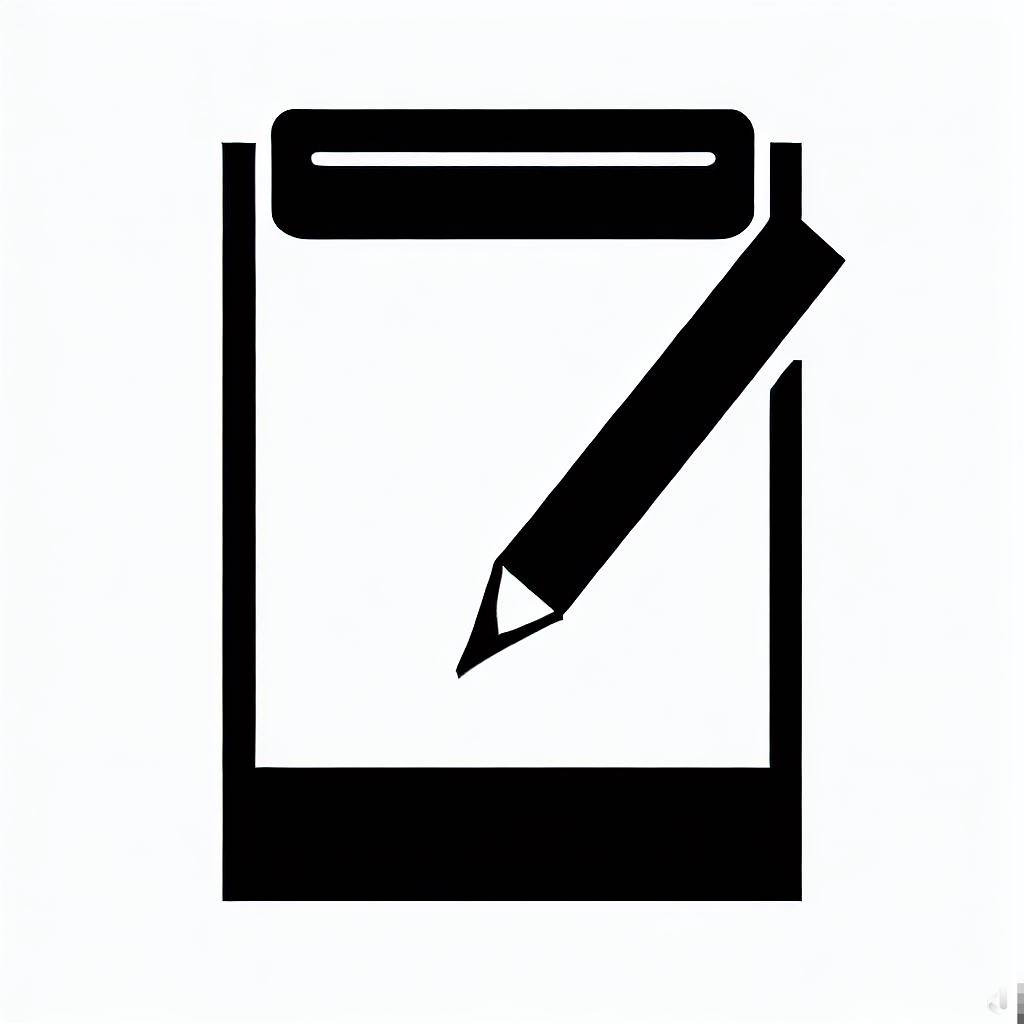분리 이론을 채택한 것은 맞고 보상입법부작위 위헌설도 맞다. 하지만 보상입법부작위위헌설과 불가분조항 문제와는 논리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다. 또한 23조 3항의 효력 논의와도 별 상관이 없다. 단지 외형상 비슷해 보일 뿐이다.
보상입법부작위위헌설은 분리이론의 입장에서 보상을 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보는 반면 불가분조항은 제한을 공용침해로 일단 인정하고 보상입법을 하여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판례와 분리이론에서 보상은 37조2항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23조 3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3조3항 논의 목차에 넣는 것은 경계 이론 학습상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크다.
또 다른 오해는 판례의 취지에 따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이다.
판례에는 "입법자는 지정의 해제 또는 토지매수청구권 제도와 같이 금전보상에 갈음하거나 기타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등 여러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문장이 있다.
문제가 되는 표현은 "토지매수청구권 제도와 같이 금전보상에 갈음"이란 부분이다.
이 표현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킨다.
개특법상 매수시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가치 감소가 반영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액을 평가한다. 금전보상이란 표현에서 재산권 보상의 목적은 구역 지정에 의한 현저한 가치 감소분을 보전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치 감소분이 반영된 상태 대로 매수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대법원은 가치 하락에 대해서는 사회적 제약이므로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 판시한 바 있다.
종전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지 못하거나 사용할 방법이 없게 된다는 것은 재산권 보장에 대한 내용인 헌법 제23조 제1항 위반이 된다. 종전 목적대로 사용 수익이 불가능 하게 된 토지의 재산권을 사인이 아닌 국가에 귀속시킨다면 과도한 침해 상태 여부를 형량하는 제37조 제2항의 저울에서 토지소유자의 몫의 추를 제거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입법이다.
한편, 도시계획시설사업부지로 편입된 후 10년동안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은 개발제한구역과 성격이 다르다.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특정 목적의 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써 개별적 제한이고 특별한 희생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매수청구시 제한이 없는 상태로 매수하기 때문에 토지의 온전한 가치를 보상받는다.
반면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의 매수청구제도는 제한을 받아 가치가 감소한 상태 대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매수청구제도는 보상 입법이 아니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