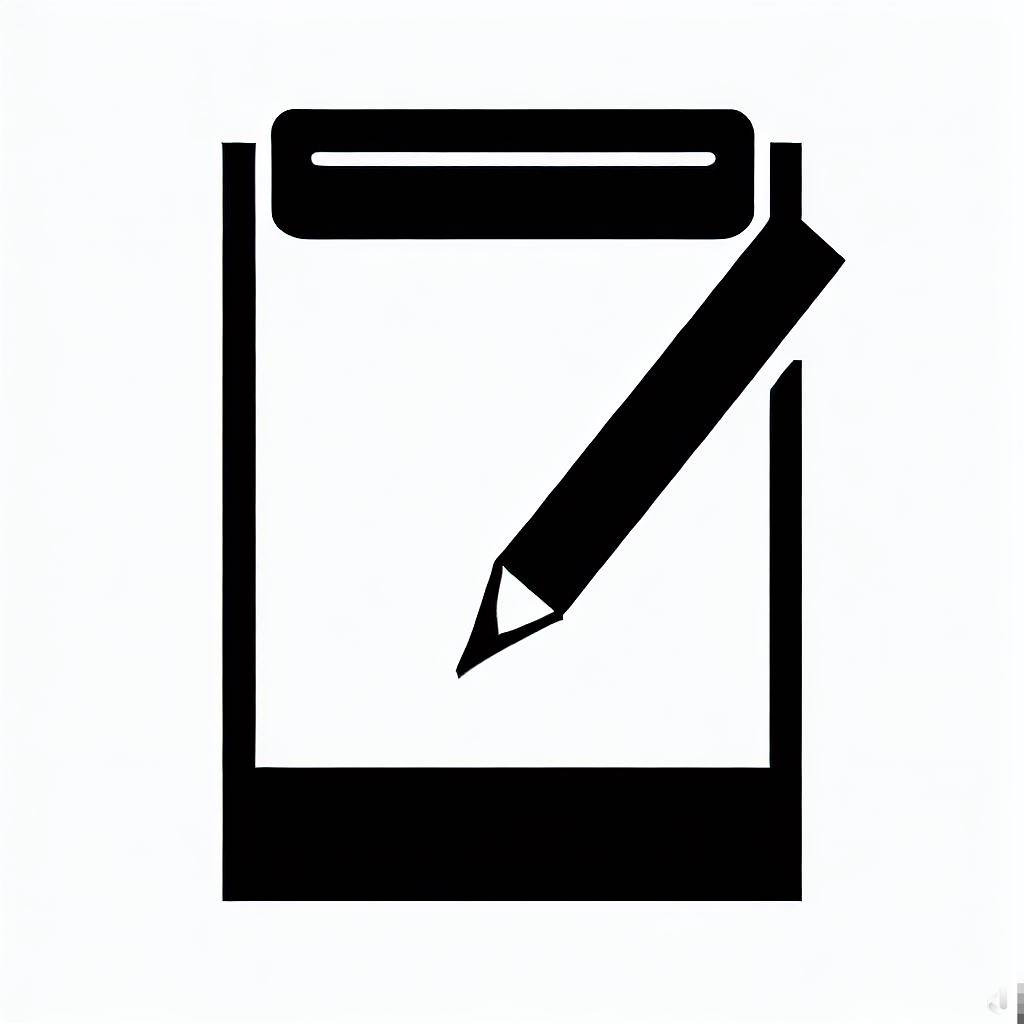법조문만 보면 별로 어렵지 않을것 같은데 막상 겪어보면 만만치가 않다.
일단 취득시효를 완성하면 등기명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생기는데 이게 채권적 청구권이다.
즉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등기 명의인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양수인은 제3자에 해당하여 시효가 중단되고 새로 기산된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20년이 아니라 100년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등기명의인이 오늘 팔아 치우면 100년간의 법적 안정성이 무너지게 된다. 문제는 선의의 자주점유자라면 그 땅이 당연히 자기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당연히 등기명의인이라고 믿고 있어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적 공부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른 경우라면 더 그럴 것이다.
측량을 해서 공부상 경계에 정확히 담을 쌓지 않는 이상 새로 이사온 이웃은 언제든 내가 오랜 기간 소유의 의사로 사용하던 땅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시효완성에 의한 등기청구권이 있음을 안 즉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공부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달라서 일부에 대해서만 시효취득한 경우에는 분필 후 등기해야 한다. 대법원은 토지의 일부에 대한 등기는 청구할 수 없어 등기하지 않아도 시효취득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분필등기를 해서 취득을 했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기각한 바 있다.
전 등기명의인이 시효의 완성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을 적극 호도하여 소유권을 이전시켰다면 103조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지만, 시효 완성자 입장에서 불법행위 여부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일단 전 등기명의인이 시효 완성을 알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소를 제기하여 등기 청구를 했던 사실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시효완성을 주장한 것 만으로는 어디까지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그런 주장은 시효완성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게 하는 사건일 수는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등기명의인이 시효 완성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